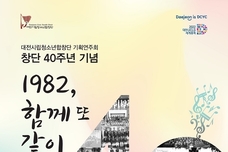명절에는 지지하는 당은 달라도 한 가족이 모여 화합하고 즐거운 자리를 마련한다. 이것이 추석 명절이다. 추석은 정치적 대립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판은 다르다. 명절 인사조차 선거를 향한 경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거리마다 걸린 플래카드 속에는 국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보다 정치적 계산이 더 짙게 묻어난다. 민심을 챙기겠다면서도 정작 민심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정쟁의 휴식”임을 모른 채, 명절마저 정치적 무대 삼아 버린 것이다.
정치가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하고, 명절에 민심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선거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명절 인사 속에 교묘히 선거 메시지를 끼워 넣는 행태는 정치 불신을 키운다. “명절 인사”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읽히는 이유다.
정치의 본령은 표 구걸이보다 민심 경청에 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화려한 현수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젊은 세대의 일자리 고민, 고령층의 복지 문제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을 놓치고 그저 대형 현수막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면, 결국 ‘정치 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원래 화합과 나눔의 자리다. 당이 달라도 가족이 모여 수고를 달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한 해의 풍요로움을 기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마저도 놓치지 않는다. 올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거리마다 현수막을 내걸었다. 명절 인사를 빙자한 정치 홍보이자, 내년 선거를 의식한 발걸음이 분명하다.
국민은 명절에 정치 홍보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물가 걱정과 생계 부담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싶을 뿐이다. 정당들이 진정으로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현수막에 글자를 새기기보다 국민의 고충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추석 밥상머리에서조차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화합과 공감의 이야기가 오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되새겨야 할 ‘민족 최대 명절’의 참된 의미다.